
알렉상드르 뒤마의 '프랑스 역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를 서술한 책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 권력, 그리고 자유에 대한 서사시다. 뒤마는 문학가의 시선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며, 건조한 연대기 대신 인간의 감정이 살아 있는 이야기로 과거를 되살린다. 그가 묘사한 프랑스의 역사는 피와 혼인으로 얽힌 복잡한 관계망이었고, 그 속에서 한 시대의 희극과 비극이 교차했다.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프랑스의 역사가 곧 유럽의 역사였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왕실은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혼인은 곧 외교였고, 사랑은 정치의 언어로 대체되었다. 딸 하나의 결혼은 국경을 바꾸었고, 사위 하나의 야망은 전쟁을 불러왔다. 혈연은 연합의 끈이었지만, 동시에 전쟁의 명분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왕가의 결혼은 대륙 전체를 얽어매는 거대한 그물이 되었고, 그 속에서 수많은 개인의 삶이 희생되었다.
뒤마는 이러한 사실을 단순히 비판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본다. 권력을 향한 욕망, 명예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언어의 교묘함을 그는 냉정하게 그려낸다. 왕들은 신의 뜻을 말하며 전쟁을 일으켰고, 귀족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념의 이면에는 ‘자기 이익’이라는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대가를 치른 것은 이름 없는 시민들이었다.
프랑스의 백성들은 왕들의 전쟁 속에서 세금을 내고,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고통이 혁명의 불씨를 잉태했다. 역설적으로, 권력자들이 쌓아올린 피의 역사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뒤마는 이 흐름을 탁월한 서사 감각으로 엮어내며, 인간의 어리석음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의식인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포착한다. 그것이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이 된 진짜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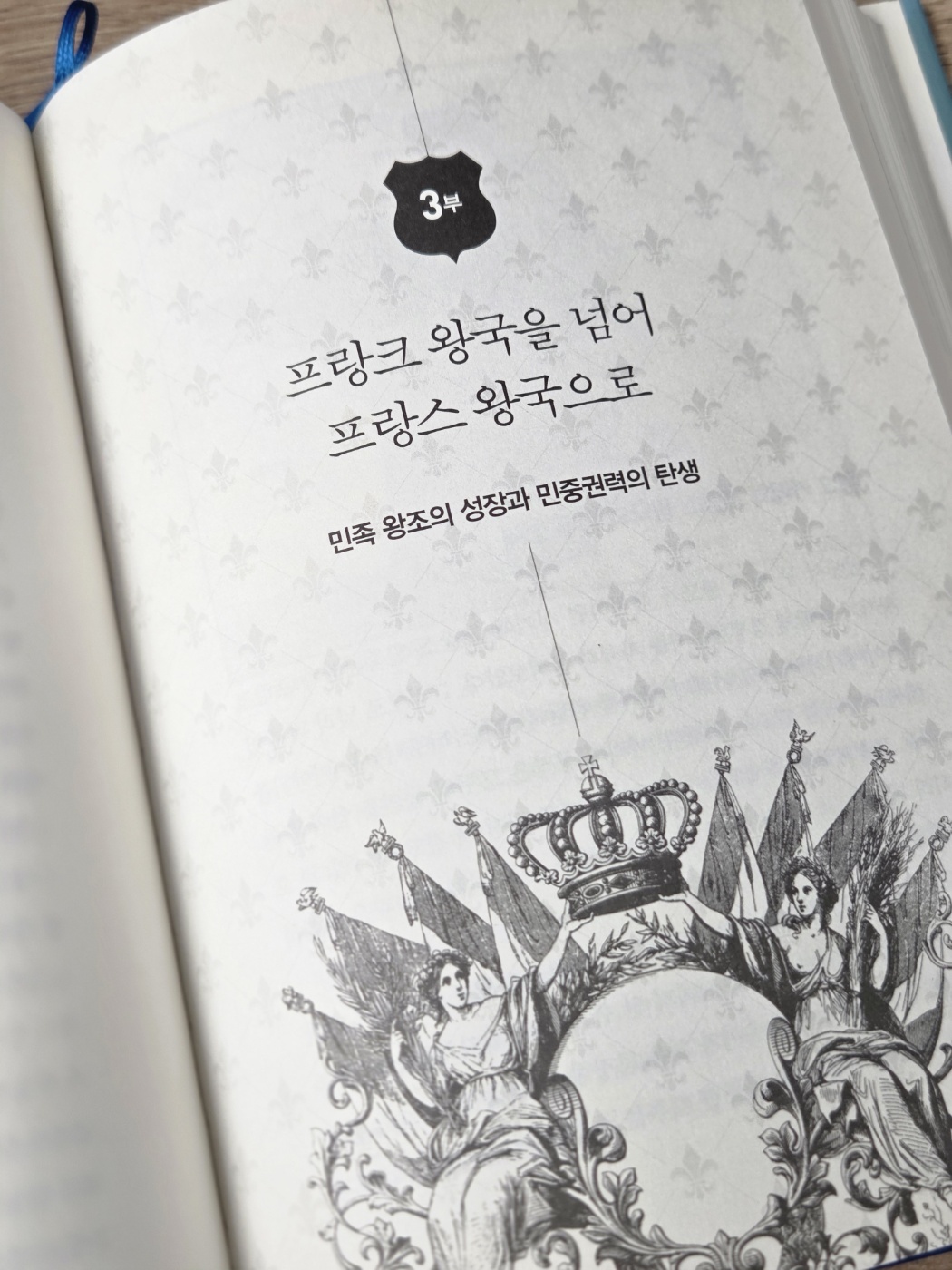
프랑스의 혁명은 단지 정치 체제의 변혁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다시 정의한 사건이었다. 더 이상 신이나 왕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을 세운 인간의 탄생. 뒤마의 문장은 그 순간을 향해 나아간다. 그는 피의 역사 속에서도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임을 믿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프랑스 역사'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서사로 완성된다.
이 책을 덮고 나면, 우리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인간은 과연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뒤마는 과거의 군주와 영웅들의 이야기를 빌려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여전히 이해관계로 얽혀 있으며, 사랑과 권력,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혼인의 정치가 기업의 합병으로, 전쟁이 경제 경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렇기에 '프랑스 역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은 단순히 프랑스의 자부심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다. 뒤마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국가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인간의 욕망을 본다. 그러나 동시에, 그 욕망을 넘어서는 인간의 가능성, 정의와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목격한다.
결국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장 먼저 ‘자유를 위한 고통’을 견뎠기 때문이다. 뒤마는 그 과정을 문학으로 기록함으로써, 역사와 인간, 그리고 예술을 하나로 엮어냈다. '프랑스 역사'는 피로 쓰였지만, 그 피 위에 세워진 것은 인간의 존엄이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성장한 이야기’로 남는다.
'인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화 '쉰들러 리스트' - 인간을 구한 인간 (0) | 2025.10.15 |
|---|---|
| 우리가 잃어버린 것 11 - 웃음 (0) | 2025.10.14 |
| 오페라 '돈 파스콸레' - 웃음 속의 인간 본성 (0) | 2025.10.11 |
| 사실주의 화가, 장-프랑수아 밀레 - 자연과 인간의 존엄을 그린 화가 (0) | 2025.10.10 |
| 머리로 우주를 탐구한 과학자 - 스티븐 호킹 (0) | 2025.10.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