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어린이 오페라를 작업한다. 최대한 어린이의 시선과 생각을 고려하며 준비한다. 아이들의 반응을 신경쓰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유투브를 보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꽤 연구한다. 하지만 공연을 하다보면 열심히 준비한 부분보다 더 뜨거운 반응이 일어난 곳이 있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부분,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에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다.
어제 어린이 오페라 '혹부리가 되고 싶은 도깨비'를 올렸다. 이번에도 나름 준비를 한 부분들이 반응이 좋았다. 어제도 역시 한 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었다. 줄곧 연습할 때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다. 나의 예상은 아이들이 웃을거라고 생각했다.
도깨비 배역이 노래대회에서 가사를 틀려서 당황하는 모습을 연기한다. 당황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다. 이 때, 아이들은 거의 동시에 '괜찮아' ,'힘내' 라며 소리를 친다. 아이들의 격려와 위로의 소리는 오케스트라를 뚫고 온 극장을 채웠다. 뒤에서 홀로 보고 있던 내 눈에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왜 흘렀을까?
공연 후, 정신없이 정리하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아이들은 실수를 어떻게 볼까?
아이들은 실수를 자연스러운 일, 일어날 수 있는 일, 혹은 잠깐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단다. 누군가 넘어지면, '괜찮아, 다시 해봐' 라고 하고, 누군가 울면, '왜 울어? 나랑 놀자'라고 한다. 아이들의 세계에는 결함에 대한 낙인이 없다.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고, 용서와 회복은 당연한 흐름이다. 결론은 사람을 실수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실수했다와 실수하는 존재를 구분한다.
어른들은 실수를 어떻게 볼까?
어른이 되면 실수는 더 이상 '경험'이 아닌 '책임' ,'평가' , '낙인'으로 변한다. 사회적 시선의 무게와 자기검열과 수치심 그리고 은폐와 관리로 변한다. 변하는 것이 잘못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와 무엇 때문에 변하는 가를 알아야 삐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수는 평가의 도구가 되고, 때론 인간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실수 하나로 존재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실수를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지만, 어른은 실수를 숨기려한다. 왜냐하면 실수는 곧 무능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실수를 '치유'하기보다 '관리' , '은폐'하려 한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아이는 사람을 보고, 어른은 결과를 본다. 아이는 가능성을 보고, 어른은 위험을 본다. 아이는 함께하려 하고, 어른은 판단하려 한다.
어제 아이들에게 목청이 터져라 외쳤던 '괜찮아'라는 말은 지금 나 자신의 삐딱한 시선과 실수를 은폐하려는 것에 대한 격려이자 위로였다. 실수는 벌이 아니라 배움으로, 부끄러움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보자. 실수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배움의 기회가 된다. 실수를 지적하며 고쳐줄 수 있지만 존재를 실수로 판단하는 것은 접어두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실수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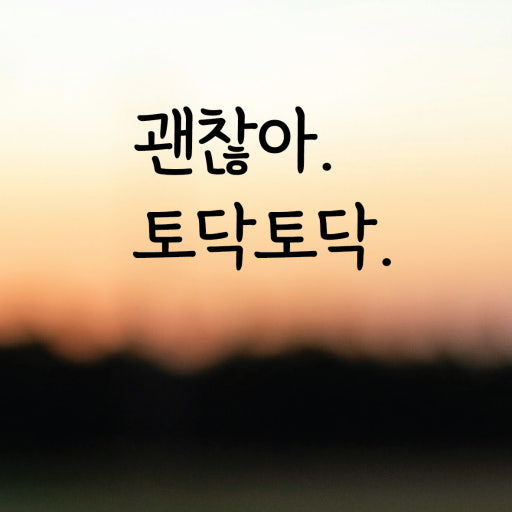
'인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후기 낭만 미술가 -구스타프 클림트, 침묵, 욕망 그리고 죽음 (0) | 2025.07.09 |
|---|---|
| 찰스 다윈 - 진화론, 과학에서 인문학으로 (0) | 2025.07.08 |
| 상식(Common Sense)이란? 그 기준은? (0) | 2025.07.04 |
| 오페라 '잔니 스키키' - 가족, 욕망과 반전 (0) | 2025.07.03 |
| 영화 '인셉션' - 인간 내면으로의 꿈속 여행 (0) | 2025.07.02 |



